일본 6만 1,409점
미국 2만 7,726점
중국 3,981점
영국 3,628점
러시아 2,693점
독일 2,260점
프랑스 2,093점
덴마크 1,278점
카자흐스탄 1,024점
오스트리아 741점
이 숫자들은 해당 국가에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재 숫자를 보여줍니다.
이렇게도 많은 문화재들이 다양한 국가에 퍼져있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우리나라 조상들의 얼과 삶이 살아 숨쉬는 것들이고, 우리의 다음세대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할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런 유산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반환 받는 일이 계속 번복되고 힘든 유산들도 있습니다. 이 유산들은 반드시 우리나라로 되돌아 와야 합니다. 21세기는 문화재 반환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지금이 우리나라 유산들을 반환 받을 가장 좋은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퍼져 있는 반크 동아리에 소속된 청소년과 청년들은 각 지역별로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들을 조사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각 지방 문화재청에 반환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전 세계 초중고 대학생, 교사들과 온라인 교류를 통해 해외 유출된 한국 문화재는 한국인들의 정신과 영혼이 담긴 보물이며 한국의 역사이기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세계인들을 설득하고자 합니다.
이제 문화재 반환과 환수 의무는 양심 있는 선진국 국민들로서, 문화를 사랑하는 강대국 국민들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식인들로서, 반드시 지켜야할 세계 질서이자 도리입니다.
1. 세계는 지금 문화재 반환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10년 11월.
미국은 예일대학교가 보관하고 있던 잉카문명의 유물 4만 6,000점을 모두 페루에 반환하기로 약속했다.
연구를 이유로 18개월 대여 형식으로 빌려간 유물이 무려 100년 만에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나라 페루.
그러나 그들에게는 미국이라는 강대국조차 꺾을 수 없는 숭고한 정신의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조상들의 유물을 되찾겠다는 페루 정부와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이었다.
이집트는 문화재 반환 운동의 개척자이다.
2010년 영국 런던대학교는 20만 년 전 구석기 유물을 되돌려 주어야 했고
프랑스는 이집트 ‘왕들의 계곡’ 근처 무덤에서 출토된 벽화 부조를 이집트에 반환해야 했다.
최근 8년간 이집트가 반환 받은 해외 유출 문화재는 무려 3만 1,000여점에 이른다.
중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가 약탈해간 문화재 실태 파악을 위해 전담팀까지 구성하였다.
중국 국가문물국은 이 실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국가들에게 공식적인 반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약탈 문화재를 돌려받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공식적으로 확인 된 해외 유출 문화재는 무려 7만4,000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박물관과 전시관 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소재 파악이 힘든 개인 소장 유물들까지 모두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60년간 회수한 문화재는 불과 5,000점.
이집트가 8년간 3만 1,000여점을 반환 받고,
페루가 4만 6,000점을 되찾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2. 되돌아온 한국의 해외 유출 문화재
2010년 일본은 한국의 도서 문화재 1,205책을 반환키로 했다.
반환 도서 가운데 특히 조선왕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에서 거행된 황제 즉위식, 세자 책봉식, 결혼식 등 주요 행사를 그림과 글로 세밀하게 기록한 것으로써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귀중한 역사 기록물이다. 그러나 우리가 요구하고 기대했던 문화재는 제외하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반환 대상을 결정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겼다.
현재 일본은 총 6만 점이 넘는 한국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다. 이번에 반환하게 될 1,200여권의 도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프랑스 역시 1866년 강화도를 습격해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 298권을 모두 반환키로 하였다.
프랑스는 한국의 끊임없는 반환 요구를 번번이 거절해왔다. 이번 반환은 프랑스와 협상하기 시작한지 19년 만에 얻어낸 결실이었다. 약탈 당한지 무려 1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했다.
3. Go! 직지 원정대
한국인들이 해외 유출 문화재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절’이다.
‘직지’는 19세기 말 주한 프랑스대사로 근무한 꼴랭 드 쁠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 프랑스로 가져가 현재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인쇄 연도는 1377년으로 구텐베르크의 42행 성서 보다 78년이나 빨랐고 199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 처음 소개되어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함으로써 서양 중심으로 기록되어 온 인쇄 역사를 한국 중심으로 다시 쓰게 만들었다.
세계 유명 언론들은 지난 1,000년간 인류문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으로 금속활자를 꼽았다. 그리고 ‘직지’는 2001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한국인들에게 ‘직지’는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그러나 프랑스 국립도서관은 ‘직지’ 반환은 물론 임대 형식의 반환조차도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들은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 소송을 통해 100% 모두 되돌려 받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이제 프랑스는 문화 강국이라는 자부심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야 할 때이다.
4. 유출 문화재 반환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문화재 반환 대상의 범주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전쟁 때 유출된 문화재.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
식민지배 또는 외국군 점령 때 이전된 문화재.
옛 소련처럼 한 국가가 여러 나라로 분리되면서 소유권이 바뀐 문화재이다.
1970년 제16차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문화재의 불법 반출·소유권 양도 금지와 예방 수단에 관한 협약’은 (간격 많이 주기) 이 가운데 두 번째 범주인 도굴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적용되는 국제협약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협약마저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무엇보다 식민지배 당시 유출된 문화재 반환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소유주로부터 기증을 받거나 구입하는 방법 외에는 이해 당사국 정부 간 협상으로 풀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해외로 유출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첫째,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를 설립하여 유출 문화재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둘째, 치밀한 역사적 검증을 통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관련 기관이 앞장서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넷째, 문화재를 빼앗아간 나라 국민들이 한국에서 가져온 보물을 되돌려 주자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설득해야 나가야 한다.
다섯째, 이집트, 인도, 그리스, 중국 등과 같이 문화재 약탈 피해 국가들이 힘을 모아 국제적 공조활동을 통해 문화재 약탈 문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장기적이며 지속적인 반환운동을 펼쳐야 한다.
여섯째. 돌려받은 문화재에 대한 관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화재의 가치에 따라 국보 지정 등 후속 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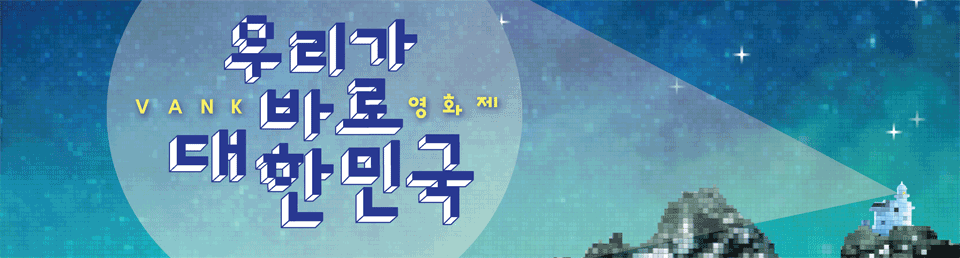
0 Comments
You can be the first one to leave a comment.